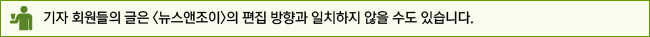어느날, 내 책상에 누가 갖다 놨는지는 모르지만 귤 한개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가만보니 또 누군가가 살짝 그 귤을 집어가는 것이었다. 그래도 나는 내 일만 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밖에 잠깐 나갔는데 몇 명 서있던 학생들 중에서 문용동, 이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면서 '내가 귤 가져갔다' 말했다. 얼굴이 빨개져서.
그때 무슨 대답이라도 좀 할 것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다. 그런 류의 일은 가끔씩 있는 일이기도 하므로 그냥 남학생들이 웃느라고 하는 장난쯤으로 생각해버리고 말았던 것 같다.
그 다음날이었다. 귤 한 개가 다시 놓여 있었다. 귤 가져갔다고 말하면 내가 한마디라도 '잘했다'라든지 '그랬느냐' 라든지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자, 말도 없이 남의 책상에 손을 댔다고 화가 난줄 알고 다시 귤을 갖다놓은 것인지도 모른다. 지금까지도 나는 그 귤을 문용동 전도사가 다시 갖다 놓은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마음이 여린 사람으로 나는 문용동전도사를 기억하고 있다.
1980년 5월 18일을 전후로 매일 세상은 복잡하였다. 데모, 시위, 화염병, 최류탄, 전경들.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일상의 문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시끄러워 나가보면 유리창 다 깨진 버스를 탄 젊은이들이 '전두환 물러가라'를 외치고 있었다.
나는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다. 저 사람이 누구인데 물러가라고 하는가, 했다. 나중에 보니까 전두환은 대통령이 되어 있었다. 전두환은 영웅이 되었고 그때 참혹하게 죽은 많은 사람들은 '폭도' 아니면 '공산당 의 사주 받은 무리들'이 되어 있었다.
아니다. 아예 광주 자체를 <과격한 사람들만 모여사는 도시>라고 매도했다. 그때의 실상을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 이상한 문화가 생겨났다. 광주에서 있었던 그 기막힌 억울함을 목소리 높여 말하면 그것 자체를 용공이나 공산당 쪽으로 몰고 갔다.
나는 결혼(1980.10)후 전라북도에서 15년 가까이 살았다. 그곳도 분명히 전라도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싶었다.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으니 모른다는 식이었다.
큰언니가 사는 충청도 지역은 더했다. 5.18비디오를 보고는 '모두 꾸민 것이다. 제작한 것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수 있단 말인가. 공수부대원이 그런 사람들 인줄 아는가.' 믿는 것은 고사하고 눈에 불을 켜면서 달려들더라는 소리를 들었다. 국민들이 5.18을 놓고 이렇게 '정말 그런 일이 있긴 있었나 보구나' 하고 납득할 수 있게 된 것도 불과 몇 년 전부터이다.
문용동은 상무대교회 교육 전도사였다. 문전도사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엄군에게 머리를 심하게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있는 노인을 발견했다. 이 노인분을 전대병원 응급실에 모셔다 주고는 문용동은 그 길로 온통 난리범벅이 되어 있는 금남로를 떠날수가 없었던 거다.
아수라장. 신문도 방송도 치안도 모두 부재였다. 내키는대로 총을 쏘았고 그냥 총 맞으면 죽었다. 왜 죽였느냐고 어디에 대고 말할 곳도 없었다. 그야말로 죽은 사람만 억울할 뿐인 개죽음이었다. 세상에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그런 상황이 그때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도청안에는 아주 위험한 다이너마이트가 있었다. 만약 터지기라도 하면 절대 안되므로 문전도사와 함께 4명의 다른 사람이 이 무기고를 지키고 있었는데 2명은 가고 나중에는 2명만 남게되었다. 27일 새벽, 계엄군의 진압작전이 시작되었다.
셀수없이 쏘아대는 총알을 피해 숨어있던 문전도사와 다른 한사람(김영복)은 헬기에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는 소리를 들었다. 총소리도 멈추었고 헬기에서 하는 말을 이 두 사람은 믿었다. 안심이 되어 문을 열고 나갔는데 나가는 순간 자동으로 쏘아대는 총을 맞았다. 앞에 가던 문전도사는 가슴에 3발을 맞아 사망했고 뒤에 있던 김영복은 파편에 맞은채 의식을 잃었으나 다행히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어이없게 문용동은 죽었다. 문용동 전도사는 처음에는 폭도라는 이름으로 한참 동안 신문이나 방송에서 오르내리더니 몇년전쯤 부터는 열사, 심지어 순교자 라고까지 들먹여졌다.
해마다 호남신학대학교에서는 '문용동5.18추모예배'를 드리고 있다. 문전도사와 나의 남편은 이 학교의 동기이기도 하다. 학교에서 2000년도에 명예졸업장을 수여했고 2001년도에는 학교 운동장 한켠에 추모비를 만들어놓기도 했다.
훗날 식구들에 의해서 발견된 문용동전도사의 유품중에는 생전에 적어놓은 시, 여러 가지 단상들을 적어 놓은 글들이 있었다. 이 글들을 정리해서 작게 만들어놓은 책을 나는 읽어본 적이 있다.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오는 글들이었다.
마찬가지로 5.18 그 혼란의 와중에서도 틈틈이 수첩에 무엇인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자신이 직접 쓴 그 중의 내용 한 부분을 여기에 그대로 적는다. 이 글은 현재 문용동 전도사가 묻혀있는 망월동, 자신의 묘비에 적혀있는 내용이다.
"군의 투입, 공수부대 개입.
드디어 터질것이 터져 버렸다.
반 기절한 시민을 업어다 병원에서 치료했다.
맞은 상처도 치료했다.
누가 이 시민에게 돌을, 각목을, 총기를 들게 했는가.
이 엄청난 시민들의 분노는 어떻게 배상해 줄 것인가.
대열의 최전방에서 외치고, 막고, 자제시키던 내가 적색분자란 말인가...
뭔가를, 진정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보여줘야 한다.
역사의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