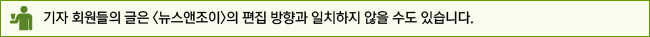최근에 출간된 유시민의 <나의 한국현대사 1959-2014, 55년의 기록>(돌베개)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의 에필로그 제목이 '세월호의 비극, 우리 안의 미래'입니다. 유시민은 여기서, "세월호의 비극은 산업화 시대 이후 사회를 지배해 온 물질적 욕망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생얼'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412쪽)"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유시민은 "…세월호는 진도 앞바다가 아니라 욕망의 바다에 침몰했다고 할 수 있다(412쪽)"까지 말합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는 사람보다 물질적 욕망을 더 숭배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더 숭배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회는 사람이 죽는 걸 그럴 수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정도로 마음에 굳은살이 박힌 사회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은 사람의 인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출간된 기록 노동자 희정이 쓴 <노동자, 쓰러지다>(오월의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는 '르포, 한 해 2000명이 일하다 죽는 사회를 기록하다'입니다. 여러분은 일하다가 한 해 2000명이 죽는다는 말이 과연 어떻게 들리십니까? 일 년이 365일이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일하다가 5~6명이 죽는 것입니다. 주 5일 노동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일하다가 7~8명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이 어떻습니까?
이 책을 기록한 저자는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 재해를 취재하다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스웨덴 사람에게 "스웨덴에서는 사람이 일하다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일하다가 왜 죽느냐?"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 글을 읽고, 머리를 한 방 맞은 것처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저도 사람이 일하다가 죽을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다가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듣습니다. 또 그동안 살아오면서 주변에서 그런 소식을 종종 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일하다가 왜 죽느냐고 한 번도 반문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사회는 사람이 일하다가 죽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문하지만, 또 어떤 사회는 일하다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수긍하는 사회입니다.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존엄함을, 사람의 소중함을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톨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가톨릭이 한국 사회의 뚜렷한 종교로 존재하는데도 왜 이럴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가르침은 성경 안에 갇혀있는 화석화한 교리입니까? 진화론에 대해서는 거품을 물고 창조론이 옳다고 반박하면서, 창조론의 꽃인 사람에 대해서는 현실에서 왜 이렇게 무감각할까요? 역시 신앙 따로, 사는 것 따로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예배당만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진 생각과 태도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사람과 생명에 대해서 이제는 전과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사람이 다 똑같지 않다는,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다는 봉건적 사고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현실에서 그런 힘을 발휘하는 봉건적인 사고에 대해서 이제는 아니라고 기독교가 말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줄 수 있는 귀한 선물 중 하나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고귀한 존재라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사람에 대한 인권 의식으로 드러나야 하고, 법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사람의 인권을 더 깊이 고민하기 위해 네 권의 책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소개하는 책은 <세상을 바꾼 인권>(이경주, 다른)입니다. 청소년 책이지만, 인권에 대한 첫 책으로 손색이 없는 책입니다. 인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 책은 그동안 이념의 군림 때문에 가려져 있던 인권이 21세기의 화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권 역시 지난한 과정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인권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왔는지 세계사적인 맥락을 짚어 주면서, 한국 사회에서의 인권을 한국 헌정사와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의 한국 사회와 관련된 인권의 다양한 모습(인터넷·청소년·평화·생명·외국인)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인권이 결국 우리 삶을 바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으로 <불편해도 괜찮아>(김두식, 창비)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사람이 좋아하고 자주 보는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인권 이야기를 친근하게 풀어 가고 있습니다. 저자의 말대로, "영화와 드라마는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데 그만큼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총 9장으로 된 이 책은 청소년 인권, 성소수자 인권, 여성과 폭력, 장애인 인권, 노동자의 차별과 단결, 종교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검열과 표현의 자유, 인종차별의 문제, 그리고 차별의 종착역 제노사이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인권은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고, 새로운 불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라, 함께 사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소개하는 책은 <다시, 사람이다>(고상만, 책담)입니다. 이 책은 한국 사회의 인권 현장에서 인권운동가가 길어 올린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인권은 민주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한 사회에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뿌리내리지 않으면 인권 의식이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부에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다양한 얼굴을 여덟 꼭지의 글로 풀어 내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인권 현장의 이야기를 한국 사회 약자들의 삶을 통해 아프게 짚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저자가 인권 운동을 하게 된 계기와 인권운동가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한국 사회의 인권 현주소를 재확인하고, 앞으로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할지 더 고민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책으로 <무례한 기독교>(리처드 마우, IVP)를 소개합니다. 2004년에 번역 출간된 이 책은 10년 만에 다시 확대개정판이라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때도 이 책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책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한국 기독교가 보여 준 모습은 말 그대로 무례한 기독교였습니다.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보다는 생명과 인권을 경시하는 무례한 막말을 쏟아 놓았고, 정의를 뒤틀어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종교 다원적 사회'입니다. 종교 다원적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기독교적 시민교양을 말하는 이 책은 그래서 보기 드문 책이고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 위의 글은 '바른교회아카데미'에서 펴내는 바른교회아카데미 저널 <좋은교회> 8월 호의 '소통하는 책 읽기' 코너에 실린 것입니다.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 - 편집자 주 |